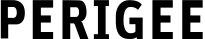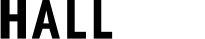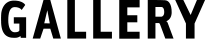Board
PERIGEE GALLERY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87
[동아일보] 동물 없는 동물원 우리로 성찰한 도시 공간
2016-12-16
노충현 개인전 ‘자리’

유채화 ‘사다리’(2016년) 앞에 앉은 노충현 작가. 그는 “우리 후면 벽체는 원래 창살인 것을 재구성한 요소다. 원숭이 우리는 특히 다른 동물 것에 비해 폐쇄적”이라고 말했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동물원의 우리는 부조리극의 무대와 닮았다. 우리 속 벽화는 그 무대 위 동물들에게는 어떤 쓸모도 없다. 우리 밖 구경꾼의 시선을 위한 장치일 뿐이다.”
내년 2월 11일까지 서울 서초구 페리지갤러리에서 열리는 노충현 작가(46)의 개인전 ‘자리’에 걸린 유채화 13점의 피사체는 ‘동물이 없는 동물원 우리’다. 노 씨는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 등의 동물 우리를 촬영한 사진에서 공간과 구조물을 선택해 조합하고 캔버스로 옮기며 동물들을 지워냈다.
관람객이 마주하는 것은 얼기설기 밧줄로 엮은 나무기둥, 덩그러니 허공에 매달린 폐타이어 그네, 동물을 그린 우리 속 벽화 등의 이미지다. 설명 없이 작품부터 만난 이 중에는 동물원 공간을 담았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
“2005년 첫 전시 기회를 얻고 뭘 그릴까 고민하다가 찾아낸 소재다. 어떤 분이 ‘목욕탕 그림 잘 봤어’ 해서 웃었던 기억이 난다. 아내가 동물원을 좋아해서 따라다니다 보니 우리라는 공간이 가진 모순이 눈에 들어왔다. 대학(홍익대 회화과)을 졸업하고 2년 정도 연극무대 미술 일을 했다. 그때 경험의 영향도 있었을 거다.”
동물원 풍경을 담은 그림에 동물을 넣으면 보는 이의 시선 초점이 동물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노 씨는 공간을 보게 하려면 그림에서 동물을 빼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 놓고 보니 ‘사용자’를 지워냈을 때 성격이 불분명해지는 전형적인 근대 도시 공간이 드러났다.
“꼬마 때 부모님을 따라 서울로 와서 죽 이 도시에서 살아왔다. 서울에서 거주하기의 복잡다단함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편이다. 마음이 복잡해질 때 한강공원에 자주 나간다. 그곳에서 그때그때 심경과 공명하는 공간을 포착해 그림으로 옮겨 왔다. ‘자리’보다 더 꾸준히 이어 온 그 연작에 ‘살풍경’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다.”
도시 공간에서 그리 예쁘지 않은 구석들을 찾아내 해석하는 노 씨의 작업은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에 가 닿는다. 그는 동물원 우리의 부조리를 현대 서울 사람들의 생활공간이 짊어진 딜레마에 연결시켜 바라본다.
“첫 시도 후 ‘자리’ 연작은 오랜 기간 길을 잃고 멈췄다. 2년 전 세월호 참사 뒤 ‘주체가 사라진 공간’의 의미를 돌아보며 작업을 재개했다. 도시 공간은 시선의 범위를 가두고 자유를 제한한다. 멀리, 가까이, 높게, 낮게…. 낮은 자리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숨통을, 그나마 한강에서 찾곤 한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유채화 ‘사다리’(2016년) 앞에 앉은 노충현 작가. 그는 “우리 후면 벽체는 원래 창살인 것을 재구성한 요소다. 원숭이 우리는 특히 다른 동물 것에 비해 폐쇄적”이라고 말했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동물원의 우리는 부조리극의 무대와 닮았다. 우리 속 벽화는 그 무대 위 동물들에게는 어떤 쓸모도 없다. 우리 밖 구경꾼의 시선을 위한 장치일 뿐이다.”
내년 2월 11일까지 서울 서초구 페리지갤러리에서 열리는 노충현 작가(46)의 개인전 ‘자리’에 걸린 유채화 13점의 피사체는 ‘동물이 없는 동물원 우리’다. 노 씨는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 등의 동물 우리를 촬영한 사진에서 공간과 구조물을 선택해 조합하고 캔버스로 옮기며 동물들을 지워냈다.
관람객이 마주하는 것은 얼기설기 밧줄로 엮은 나무기둥, 덩그러니 허공에 매달린 폐타이어 그네, 동물을 그린 우리 속 벽화 등의 이미지다. 설명 없이 작품부터 만난 이 중에는 동물원 공간을 담았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
“2005년 첫 전시 기회를 얻고 뭘 그릴까 고민하다가 찾아낸 소재다. 어떤 분이 ‘목욕탕 그림 잘 봤어’ 해서 웃었던 기억이 난다. 아내가 동물원을 좋아해서 따라다니다 보니 우리라는 공간이 가진 모순이 눈에 들어왔다. 대학(홍익대 회화과)을 졸업하고 2년 정도 연극무대 미술 일을 했다. 그때 경험의 영향도 있었을 거다.”
동물원 풍경을 담은 그림에 동물을 넣으면 보는 이의 시선 초점이 동물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노 씨는 공간을 보게 하려면 그림에서 동물을 빼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 놓고 보니 ‘사용자’를 지워냈을 때 성격이 불분명해지는 전형적인 근대 도시 공간이 드러났다.
“꼬마 때 부모님을 따라 서울로 와서 죽 이 도시에서 살아왔다. 서울에서 거주하기의 복잡다단함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편이다. 마음이 복잡해질 때 한강공원에 자주 나간다. 그곳에서 그때그때 심경과 공명하는 공간을 포착해 그림으로 옮겨 왔다. ‘자리’보다 더 꾸준히 이어 온 그 연작에 ‘살풍경’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다.”
도시 공간에서 그리 예쁘지 않은 구석들을 찾아내 해석하는 노 씨의 작업은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에 가 닿는다. 그는 동물원 우리의 부조리를 현대 서울 사람들의 생활공간이 짊어진 딜레마에 연결시켜 바라본다.
“첫 시도 후 ‘자리’ 연작은 오랜 기간 길을 잃고 멈췄다. 2년 전 세월호 참사 뒤 ‘주체가 사라진 공간’의 의미를 돌아보며 작업을 재개했다. 도시 공간은 시선의 범위를 가두고 자유를 제한한다. 멀리, 가까이, 높게, 낮게…. 낮은 자리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숨통을, 그나마 한강에서 찾곤 한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