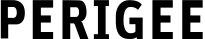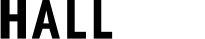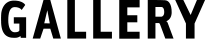Board
PERIGEE GALLERY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97
[월간디자인] 작업 시간 대부분을 그래픽 디자인에 쓰는 미술가, 또는 그 반대
2017-05-08
최근 슬기와 민은 <작품 설명>(스펙터 프레스, 2017)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한 207개의 작업에 대해 이미지 없이 글로만 설명한 책이다. 본문에는 작업의 제목을 따로 밝히지 않고 텍스트 순서대로 번호만 매겼기 때문에 설명하는 대상이 궁금할 경우 뒷장의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본문의 3번은 모다페 2005 페스티벌 포스터, 116번은 BMW 구겐하임 랩 그래픽 아이덴티티, 164번은 <메스스터디스 건축하기 전/후> 전시회 홍보물과 도록 작업을 가리킨다. ‘작업 시간 대부분을 그래픽 디자인에 쓰는 미술가(또는 그 반대)’로서 슬기와 민이 하는 일이다. 한편 14번은 ‘기능적 타이포그래피’, 136번은 <Sasa[44] 연차 보고서 2011>, 159번은 <오프화이트 페이퍼 - 브르노 비엔날레와 교육> 전시를 나타낸다. 이는 ‘작업 시간 대부분을 미술에 쓰는 디자이너(또는 그 반대)’로서 슬기와 민이 하는 활동이다. 결국 1번부터 207번까지 모두 같은 셈이다. 슬기와 민은 새로운 유형의 디자이너다.

EK 현재 페리지 갤러리에서 <슬기와 민 페리지 공육공사이일 ~일칠공오일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 갤러리 팩토리에서 개최한 첫 번째 개인전 <슬기와 민 팩토리 공육공사이일~공육공오일삼>이 떠오르는데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SM 우연히 10년 만에 단독전을 여는 것이지, 지난 시간을 정리하거나 회고하는 성격의 전시는 아니에요. 이번에는 슬기와 민의 예전 작업을 원본으로 인프라 플랫(infra-flat) 시리즈를 제작했으니까 괜히 전시 제목도 회고전처럼 지은 거죠. 관객이 그런 오해를 하길 은근히 바라기도 했고요. 두 전시가 끝나는 날짜가 같은 것도 우연일 뿐, 실제로는 그 무엇도 회고하거나 정리하지 않는 ‘가짜 회고전’이에요.
EK 슬기와 민의 작업에서 ‘인프라 플랫’은 중요한 개념이죠?
SK 2015년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후보 전시회에서 처음 선보인 후, 저희가 계속 작업하고 있는 시리즈를 부르는 말이에요. 마르셀 뒤샹이 정립한 개념 중에 ‘인프라 신(infra-thin)’이 있는데 이는 지각하기 어려운, 아주 작고 미묘한 차이를 뜻합니다. 인프라 플랫은 이에 호응하는 개념으로 세상의 두께가 평평하고 납작해진 나머지 뒤집어지면 가짜의 깊이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착안했어요. 그렇게 역전된, 마이너스 깊이감을 지나치게 가까이에서 본 듯한 이미지, 거대하고 흐릿한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죠.
SM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떤 정보든 손쉽게 접하고 즉시 소통할 수 있잖아요. 미지의 영역, 신비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만큼 세상의 두께가 얇아졌다는 얘기죠. 인프라 플랫 시리즈는 SF적 상상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이미지로 나타낸 겁니다. 작품의 이미지 하나하나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 원본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인프라 플랫 시리즈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건 저희도 모르겠는데 그냥 거기에서 느껴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미끄덩거리는 느낌이랄까. 지나치게 큰 이미지와 마주하면 어지럽기도 하고 빨려 들어갈 것 같기도 하잖아요.
EK 일반적으로 그래픽 디자이너에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인프라 플랫 시리즈는 그와 상반된 개념의 작업이군요.
SM 명확한 의사소통, 투명함, 즉시성은 디자인의 일부이고 디자이너라면 이를 구현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인프라 플랫 시리즈는 디자이너로서 하는 반성이자 한계에 대한 의식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세계를 평평하고 납작하게 만드는 것과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기능적으로는 배반이지만 유의미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SK 전시를 본 관객이 주제나 메시지를 궁금해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관람객이 전시장에 가서 그런 이미지 사이에 둘러싸여 약간은 불분명하고 어리둥절한 감각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관객도 전시의 일부가 되는 거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번 전시는 작품을 제작해 갤러리에 설치했다기보다, 특정한 공간을 구현하려고 작품을 제작했다는 표현이 더 맞아요.
5월 13일까지 페리지 갤러리에서 열리는 슬기와 민의 이번 전시는 여러모로 불분명하고 모호하다. 전시장에는 슬기와 민이 기존에 제작한 포스터, 초대장, 엽서 등의 이미지를 흐릿하고 거대하게 확대한 프린트 작업뿐 아니라 1981년 문화서적에서 펴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인프라 플랫 버전으로 변환한 〈코스모스, 한국어 3판, 1981>도 진열돼 있다. 작품의 정보를 밝히는 ‘작품 목록’ 역시 하나의 작품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페리지 060421~170513〉은 기만하는 전시회다”로 시작하는 슬기와 민이 직접 작성한 전시 소개 글을 읽으면 혼란은 더해진다. “어떻게 설명해야 설명같이 들리면서도 설명이 아니고, 어떤 부분은 해명이 되는 동시에 또 어떤 부분은 더 헷갈리게 만들까 생각하며 간간이 거짓말도 섞어 썼다”는 것이 최성민의 설명이다. 한편 전시장 안내 데스크에서는 슬기와 민이 그간 진행한 프로젝트 중 일부를 글로 설명한 〈작품 설명〉을 빌려주기도 한다. 슬기와 민은 전시 소개 글에서 이 책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이미지만 있는 전시장에 〈작품 설명〉을 들고 가서 글과 그림을 비교해가며 읽어도 좋겠지만, 아마 부질없을 것이다.” (중략)
바이라인 : 인터뷰: 전은경 편집장, 글·정리: 김민정 기자, 인물 사진: EH
디자인하우스 (월간디자인 2017년 5월호) ⓒdesign.co.kr, ⓒdesignhouse.co.kr
기사 원문 링크: http://mdesign.designhouse.co.kr/article/article_v...